대전시, 7일 '과학기술인 지역사회 발전 간담회' 열어
1세대 과학기술인 과학입국 넘어 과학선진국 과정 술회
"대전 역사 120년 중 50년이 과학기술 기반 성장"
"개척자 도시 대전, 조만간 대구를 넘고, 부산 추월"
![대덕특구 50주년을 맞아 과학기술인과 지역사회 발전 간담회가 7일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최인표 전 생명연 책임연구원, 진성일 전 충남대 교수, 한기철 전 ETRI 이동통신연구소 소장, 정광화 전 표준연 원장(잠시 자리비움), 장인순 전 원자력연 원장, 안동만 전ADD 소장, 이석봉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사진= 길애경 기자]](https://cdn.hellodd.com/news/photo/202312/102746_321897_213.jpg)
"과학기술 기반이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면서 4년 만에 유도탄 개발에 성공했다."
7일 오후 대전 유성구 대전테크노파크 어울림플라자에서 열린 '과학기술인과 지역사회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안동만 전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국가적 상황으로 본래의 연구소 이름(국방과학연구소)이 없어졌다가 다시 되찾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유도무기, 대전차, 항공기까지 무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전시가 대덕연구개발특구 조성 50주년을 맞아 지금의 우리 국가를 과학기술인들이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되돌아보기 위해 마련했다. 이석봉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 안 전 소장과 장인순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 정광화 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한기철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이동통신연구소장, 진성일 전 충남대 교수, 최인표 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1세대 과학기술인들이 참여했다.
연구개발은 마치 작전처럼 이뤄졌다. 안 전 소장은 "유도탄 개발 특명이 떨어졌는데 가족들에게 조차 말할 수 없었다"며 "개발 중에 10·26, 12·12 등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ADD 연구인력이 3분의 1로 잘리고 연구소 이름도 위장명칭도 '신성농장'에서 '대전기계창'으로 바꿔 부르곤 했다. 유도탄이 그런 어려움 속에 탄생했다"고 전했다.
장 전 원장은 "고 한필순 박사님(전 원자력연구소장)이 원자력기술 자립에 시동을 걸었을 때 '엽전이 만든 기술을 어떻게 믿냐'며 냉소하는 분위기였다"며 "우리는 부품과 설비가 부족한 걸 탓할 시간에 청계천(서울 공구상가)을 뒤져 구입하면서 최선을 다했다. 2009년 우리 기술로 만든 원자로를 수출하는 날 펑펑 울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원자력 기술 자립의 역사를 '질곡의 역사'라로 표현했다. "1979년 대통령이 연구인력 300명을 내려 보내 연구를 시작하도록 했는데 그해 10월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연구소는 폐쇄되다시피 했다. 그런 고난 속에 핵연료 국산화에 이어 원자로 기술개발까지 성공했다"고 돌이켰다.
대덕연구단지(지금의 대덕연구개발특구) 조성 당시인 1973년 무렵, 조성지인 대전 유성구 일원(당시 충남 대덕군)은 허허벌판이었다. 정부의 해외과학자 유치정책으로 우수한 과학기술인들이 속속 귀국해 대전에 정착했지만 장 전 원장의 말처럼 연구환경, 정주여건은 열악하기 그지 없었다. 더구나 당시 연구단지는 대전시가 확장되기 이전이라 도심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었다.
안 전 소장은 "대전은 교육여건이 좋지 않아 KAIST가 내려오지 않았던 시절에는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서울로 떠나야 했다"고 말했다. 장 전 원장은 "1979년에 우리 1년 연구비가 980만원이었다. 하지만 사명감으로 뭉쳤다. 해야할 연구는 해내야 한다는 각오로 일주일에 80시간씩 연구하고 일했다. 그래도 아무도 월급 더 달라, 수당 더 달라고 불평하지 않았다. 우리팀 6명의 연구자들과 토론을 하는데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봤다. 꿈이 있었고 꿈을 먹고 살았다. 우리 국민이 어느 나라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했다.
정 전 원장은 "1978년 대전 표준연에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연구비도 연구장비도 없었다. 차관을 받아 건물 지하에 장비를 구축하면서 새벽까지 연구했다. 예산은 없었지만 애국심과 자발적 의지에 불탔다. 지금은 반대인 것 같다. 과학기술 창의를 위해 자율적 도덕성이 필요하다. 감시와 감독으로 과학기술 발전이 어렵다"고 조언했다.
ETRI 전신인 통신연구소 공채 1기로 연구를 시작했다는 한 전 소장은 "1977년 전자교환기 도입시기부터 통신망 설계, TDX, CDMA, LTE 등 세계 표준 원천 특허 내고 우리 특허기술로 세계 표준화가 됐다. 장비를 수입하던 나라가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고 소개했다.
진 전 교수는 "1996년부터 9년간 과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수주를 위해 산학연협력 연구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다"면서 "당시 인천시가 선정됐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대전시와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협의회도 만들고 대전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정보화와 중소기업 지원에 기여했다"고 기억을 더듬었다.
자연살해세포 연구 권위자인 최 전 책임연구원은 "1991년 귀국해 생명연에서 30년동안 혈액 면역세포 중 10%정도인데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살해세포'만을 연구했다. 주로 급성백혈병 환자를 위한 연구였는데 그 환자들은 우리만 바라보고 있었다. 지금까지 140여명을 치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부시장은 대전은 개척자들의 도시라고 평가했다. 그는 "1905년 경부선이 놓이면서 대전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시작됐다. 1973년 대덕연구개발특구, 정부청사, 자운대 등이 내려와 대전의 역사 120년 중 50년이 과학기술 도시이다. 앞으로 150년 역사에서는 100년이 과학기술 중심 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전은 현재 상장사가 55개다. 대구가 56개인데 대전의 추세가 대구를 넘고, 5년내 부산을 추월할 것이다. 그 배경에 과학기술이 있었고 과학자들이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 2부에서 진행을 맡은 정용환 전 원자력연 원자력재료기술개발단장은 따듯한과학마을벽돌한장, 새통사, 우리마을 대학, 대덕밸리라디오 등 대덕특구의 과학기술 관련 커뮤니티를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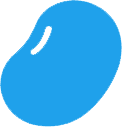
댓글 정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