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진 세종과학기술연구원 연구위원
기술도출·연구단 선정·평가위 구성·수행체계
모두 정부가 주도하거나 간섭하는 현실
"독일이나 일본이라면 국가연구소가 직접
새로운 첨단기술을 도출해 연구했을 것"
![노환진 전 UST 교수.[사진= 대덕넷 DB]](https://cdn.hellodd.com/news/photo/202405/104213_323892_4135.jpg)
◇ 출연연이 미션연구 수행토록 독립성과 자율성을
독일이나 일본이라면 이런 일을 어떻게 진행할까? 아마 국책연구소에서 직접 새로운 첨단기술을 도출하고, 가급적 기존의 연구체계 내에서 장기적으로 연구해 갈 것이다. 가족같은 친밀도를 가진 '팀 중심'의 연구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려 하기 때문이다. 여러 연구팀이 협력해 대형과제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위탁과제를 통해 대학의 지식을 흡수함으로써 국가적으로 '큰 작품'을 만들어 낸다. 그들은 정부부처가 기술을 도출하거나 연구단을 선정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술도출, 연구단 선정뿐 아니라 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과제수행체계까지 정부가 주도하거나 간섭한다. 심지어 해외평가위원을 두니, 비개방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국책연의 활동을 정부주도로 개방하는 셈이다. 예전에 출연연을 외국기관(맥킨지, ADL)이 평가하게 하는 폐단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렇다. 대학은 개인 중심의 개방적 연구체계이나 출연연은 팀 중심의 비개방적 연구체계라는 큰 차이점을 공무원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싶다. 단, 기초영역의 국책연은 개방적이어야 한다.
참고로 정부부처가 예산을 확보해 직접 연구개발사업을 추진 할 수도 있다. 그것은 정부가 공공적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과제(국가아젠다연구)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는 출연연이 스스로 도출·연구하도록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 출연연은 설립될 때, 미션(미션연구)이 정해지고 정관에 수록된다. 그런데 우리 출연연은 그 미션연구를 할 수 없다.
1993년 각 출연연에 존재하던 정책연구부서를 폐지하고, 1996년 PBS를 단행하면서부터 출연연의 미션연구는 사라진 셈이다. 정부가 출연연에 미션연구비를 예산으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28년째 우리는 이렇게 출연연의 손발·머리를 묶어놓고, 정부부처가 기술도출과 연구단 선정을 직접(전문기관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 PBS 때문에 출연연에 ‘칸막이’가 생기고 산·학·연이 폐쇄적인데, 이러한 원인을 그냥 둔 채 전략연구단으로 해결될까?
◇ 출연연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다
국책연은 국가가 설립·육성하는 연구기관이다. 출연연이란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국책연이다. 출연연은 기술별 또는 이슈별로 연구팀이 구성되며 이런 연구팀을 선택·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형식이므로, 연구대상이 되는 기술이 도출되면 그 연구를 주도할 연구팀은 자동으로 결정된다. 경쟁관계가 아니다. 어느 연구팀의 능력이 부족하면 우수한 연구자를 스카웃해 와야 한다. 그리고 연구자는 개인역량을 키우고 평가받는 엄격한 제도(tenure)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선진국의 국책연 모습이다.
국책연은 경쟁없이 연구과제가 주어지니 도덕적 해이가 오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는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추측이다. 연구자들은 기본적으로 연구활동을 즐긴다. 그래서 연구체계를 흔들지 말고 자율성을 주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데도 우리 정책에서는 출연연에 그런 기회를 준 적이 없다. 참고로 공무원 조직인 국립연도 경쟁없이 좋은 연구성과를 보이고 있다.
◇ 연구비 지원에 ‘쏠림현상’도 문제
기술도출과 연구단 선정을 정부가 주도하게 되면, 경직과 시간지연이 우려된다. 연구기관이 스스로 판단해 전략기술을 도출하고 스스로 구성한 추진체계로 연구해 가는 것이 신속하고 자연스럽다. 굳이 정부가 나서서 기술도출, 1차 심사, 2차 심사에 여러 위원회를 거치면 준비단계가 1년 넘게 소요된다. 선진국은 국책연에 일임한다. 이를 위해 국책연을 두는 것이다. 대학 연구는 경쟁이 원칙이지만 국책연의 연구는 경쟁이 없다.
그 외 부작용으로 연구비 지원에 ‘쏠림현상’이 생긴다. 2000년대 초 정부는 5T(IT, BT, NT, ST, CT)의 연구개발을 강력하게 밀고 갔었다. 그 결과 산업기술에는 연구비가 크게 줄자, 기계공학은 나노중심으로 연구방향이 틀어지고 제조업 분야의 석박사 학생이 부족해지는 현상을 겪었다.
독일·미국은 아직도 제조업 기술혁신에 역점을 두고 있고 그것이 4차 산업혁명으로 발전된 바 있다. 이에 비하면, 우리의 연구비 투자는 유행에 너무 민감하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 직후, 우리 정부는 인공지능에 수백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그 3년 전에 ETRI의 인공지능연구실이 연구비 부족으로 해체된 바 있다. PBS와 연구비 쏠림현상 때문이었다.
이렇게 선정된 전략연구단은 계획대로 종료될 수 있을까? 5년 후, 이 사업을 주도하던 고위공무원은 거의 퇴직하게 된다. 새로운 정권이 요구하는 새로운 연구사업을 두고, 이 사업에 예산을 계획대로 지원할지가 의문이다. 후임 공무원들이 전임자가 만든 연구사업을 존중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하는 사례를 여러 번 목격하였다. 과거에 선정된 연구단을 보면 알 수 있다.
◇ 연구개발사업으로 '기술'만 얻는 것이 아니다
연구비 투자로는 기술도 얻지만, 학습의 기회, 축적의 기회,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을 얻으며, 국가적으로 유능한 기술플랫폼을 얻고, 연구기관의 명성도 얻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예산구조에서부터 개선할 점이 보인다. 선진국의 연구비 예산구조는 Institutional Funding(미션 연구, Block Funding 형식)과 Project Funding(경쟁 또는 비경쟁 grant)으로 구분하고, Institutional Funding은 국가연구소 스스로 연구계획을 세워 ‘큰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연구비 투자에는 ‘선택집중의 원리’가 적용된다. 즉 여러 연구자에게 골고루 기회를 주지 않는다. 선진국을 보면, 대학과는 별개로 국가연구소를 설립하고 우수연구자를 모아 정부가 집중투자함으로써 국가적 연구역량을 높여간다. 국책연에는 다양한 기술과 이슈를 중심으로 유능한 연구팀이 존재하도록 일관성있는 선택집중적 지원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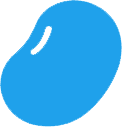
댓글 정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