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2월 비즈니스 모델 세미나 여는 윤진효 DGIST 연구원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과 비즈니스 모델 이론 전문가
오픈 이노베이션, 외국 기업들은 성공하고 우리 기업들은
실패하는 이유는 '복잡성(complexity) 관리'에 취약하기 때문
국내 최초로 글로벌 학술 저널 국제적 권위의 출판사에서 발행
한국, 노벨상 받으려면 글로벌 학술 저널과 출판사 먼저 갖춰야
"비즈니스 모델 못 찾으면 시장도 기업도 위험"
"경영학의 '오픈 이노베이션', 경제학 이론과 결합하는 게 숙원"
![윤진효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책임연구원. 그는 9월부터 12월까지 13주에 걸쳐 학교에서 '비즈니스 개발론'을 공개 강의한 다.[사진=DGIST 제공]](https://cdn.hellodd.com/news/photo/202408/105243_325418_504.jpg)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대구시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총장 이건우)에서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기반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BM) 개발 세미나’가 열린다.
‘비즈니스 모델 개발론’은 ‘개방형 혁신’이라는 의미의 오픈 이노베이션에 기반을 둔 새로운 학문 분야다. 최근 국내외 주요 대학과 기업에서 활발히 채택돼 활용되고 있다. 윤진효 DGIST ABB 연구부 책임연구원(오픈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수)이 이 학문 분야의 국내외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DGIST에서 윤 책임연구원을 만나 점차 논의와 적용 사례가 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론에 대해 인터뷰 했다. 이 주제의 기반 분야인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 그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국내에 처음 소개한 뒤 세계적인 학회와 글로벌 저널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 비즈니스 모델 개발론은 오픈 이노베이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한다. 오픈 이노베이션 얘기부터 해보자.
“오픈 이노베이션이란 연구, 개발, 상업화에 이르는 기술혁신의 모든 과정에 외부의 기술, 지식,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혁신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과 부가가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2003년에 이 이론의 창시자격인 헨리 체스브로(Henry W. Chesbrough)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가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책을 펴내면서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 국내에는 언제 들어왔나. 기자는 개인적으로 벤처기업 ‘메디슨’의 창업자이면서 벤처 대부였던 고 이민화 교수가 2010년 KAIST 과학저널리즘 석사과정에 개설한 오픈 이노베이션 강의를 들은 경험이 있다.
“최초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국내에 소개한 건 나였다. 2005년 싱가포르 국립대를 갔다가 도서관 서점에서 이 책을 발견해 그 자리에서 절반을 읽었다. 그때 마침 고려대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던 터라, 수업에 이걸 도입했다. 그 즈음 이 교수에게도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다. 그는 오픈 이노베이션 연구와 전파에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다.”
― 국내에 얼마나 확산됐나.
“개념은 도입이 됐는데 기업과 시장에 제대로 적용이 안됐다. 체스브루 책이 10만 번 인용됐다고 한다. 3만 번이 넘어가면 노벨경제학상 후보가 된다. 더구나 나처럼 이 경영학적 이론을 경제학적으로 뒷받침하는 후학 연구자들이 많아지는 만큼 분명히 노벨상을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 나는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미시 및 거시경제 이론을 시작하고 확립했다고 자부한다.”
― 기념비적 저널까지 만들었다는데···.
“초창기 이 주제에 대한 논문을 열심히 쓰던 시절이었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께서 오픈 이노베이션 분야의 저널이 있냐고 물어왔다. 그렇지 않아도 체스부르의 책을 읽고 누구나 이용 가능한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저널이 필요하다고 느끼던 터였다. 이런 개념이 적용된 오픈 이노베이션 저널 창간에 나섰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하기 위해 2005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나와 DGIST로 자리를 옮겼다. 2009년 체스부르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초빙해 강의를 들으면서 공고한 준비를 했다. 2014년 과학 학술지 네이처(Nature)를 발행하는 스프링거 네이처(Springer Nature)와 계약해 저널을 만들었다. 2023년부터는 더 권위를 인정받는 세계적인 학술 저널 발행기관 겸 학술서적 출판사인 엘스비어(Elsevier)에서 저널(Journal of Open Innovation : Technology, Market, and Complexity)을 펴내고 있다.”
― 엘스비어에서 이 저널의 성적은 어떤가.
“엘스비어가 주관하는 스코푸스(SCOPUS) 사이트스코어(citescore)가 11포인트 이니 전 세계적으로 10% 안에 든다. 최상위 랭킹이다. 2023년 기준으로 일반 경제학 분야에서 상위 1%, 사회과학-정치학 분야에서 상위 3%, 그리고 발전 연구 분야에서 상위 5% 정도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저널이 됐다.”
![윤진효 DIGIST 책임연구원이 지난해 부터 세계적인 학술 저널 발행기관 겸 학술서적 출판사인 엘스비어(Elsevier)에서 펴내고 있는 저널 'Journal of Open Innovation : Technology, Market, and Complexity'의 홈페이지[저널 홈페이지 캡처]](https://cdn.hellodd.com/news/photo/202409/105243_325472_2218.png)
― 국내에도 글로벌 저널이 필요한가.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권위있는 글로벌 저널과 이를 발행하는 권위있는 학술 출판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노벨상은 해당 분야의 학계가 51% 지분을 갖고 있다. 스웨덴 한림원은 세계적인 학술 저널의 편집장에게 노벨상 후보자를 묻는다. 일본,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 주변 국가들도 학술 분야의 글로벌 저널과 글로벌 출판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없다. 개인적으로는 삼성 같은 대기업이 권위있는 글로벌 오픈 액세스 저널 출판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초과학을 지원하는 일보다 훨씬 가치 있고 학계에 기여하는 일이다.”
― 학회도 만들었다.
“2015년 DGIST에 ‘개방형 혁신 글로벌 학회(Society of Open Innovation: Technology, Market, and Complexity)를 만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했다. 다만, 창립 기념 학회만 DGIST에서 한 뒤 지금까지 매년 해외를 돌며 학회를 한다. 홈페이지도 영어로만 돼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해서다. 저명한 키노트(기조연설) 연사도 초청하는데, 별다른 외부지원 없이 100% 등록비로 충당한다. 우리 학회가 최고라는 자부심이 있다. 첼스부르가 주관하는 '월드 오픈 이노베이션 학회'가 미국에 있는데 한번은 이 학회 멤버를 키노트에 초빙했더니 우리보고 아시아 지부를 하라고 하더라. 단호히 거부했다.”
― 오픈 이노베이션을 비즈니스 모델 개발론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오픈 이노베이션은 기술과 시장을 연결하는 거다. 기술 주인, 시장 주인이 따로 있는데 이 둘을 연결하는 게 오픈 이노베이션이다. 오픈 이노베이션이 구체화되면 비즈니스 모델이 된다. 오픈 이노베이션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거다. 비즈니스 모델은 세상에 존재하는 기술과 시장을, 혹은 세상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기술과 시장을 창조적으로 결합한다.”
― 그동안 어떻게 연구해 왔나.
“이 이론에 대한 영문 단행본 2권을 펴냈고 관련 논문 100편 가까이를 TFSC(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등 글로벌 톱 저널들에 실었다. 조만간 그동안 정리한 개방형 혁신 기반 비즈니스 모델 연구 및 사례를 종합한 ‘비즈니스 모델 사각형 나침반(BM Rectangular Compass)’ 에 대한 3번째 영문 단행본을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출판사에서 펴낼 계획이다. 비즈니스 모델로 50여 개 특허를 고안해 이 가운데 40여 개를 등록하고 10개를 이전했다. 기술을 시장에 연결하는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방법론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5W1H 원칙’이라고 부른다. WHO(구체적 고객), WHAT(제공하는 가치), HOW(비즈니스 모델 운영 시스템), WHY(비용과 이익), WHEN & WHERE(고객과의 접점 시간과 장소) 등으로 구성된다.”
― 비즈니스 모델 개발론은 확산 일로에 있나.
“국내외 주요 대학과 기업에서 활발히 채택돼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대, 한림대 등 주요 대학과 삼성인력개발 등 유수한 기업들이 나의 '비즈니스 모델 사각형 나침반' 이론을 교육하고 활용한다. 이탈리아 나폴리대, 영국의 스완지대, 일본 메이조대, 중국 난징공업대 등 세계 100여 군데서 이 방법론을 가르친다. 사실 미국의 탑 클래스 기술경영학 석사과정(MBA)은 대부분 비즈니스 모델 개발론을 강의한다”
― 오픈 이노베이션의 보완적 이론인가.
“오픈 이노베이션의 약점은 복잡성(complexity)이 커진다는 점이다. 같이 하면서 생기는 복잡성이다. 애플은 아이폰을 만들기 위해 13~14개 기업을 인수합병(M&A)했다. M&A를 통해 혼자 개발하려면 20~30년 걸릴 시간을 단축했는데 대가를 충분히 지불했다. M&A에 그치지 않고 해당 회사 인재들에게 부문장을 맡겨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이럴 경우 일의 방식과 근무 문화 등 다양한 복잡성이 발생하는데 잘 관리해 성공했다. 우리 기업들은 복잡성 관리에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 확산이 잘 안된다. 이럴 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
― 적절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때로 위험해 질 수 있다. 기술과 시장이 바뀌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 원격의료 서비스가 그런 예다. 한국의 원격의료 환경은 이미 갖춰져 있다. 의료 수준이 높고 정보기술(IT) 인프라가 강하다. 그런데 의료계의 반대로 원격의료 서비스가 미뤄지고 있다. 하지만 원격의료 서비스 도입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져 간다. 원격의료 서비스 부재로 생명까지 잃는 부작용이 속출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원격의료 시스템이 고도로 발달했다.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지 못한 사이 어느 날 한국의 원격의료 시장이 열린다고 생각해보라. 우리 의료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거다.”
― 얼마 전, 재무 데이터를 통한 개방형 혁신 여부를 분석하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특허데이터 분석팀(정의섭 박사) 및 김봉환 서울대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재무 데이터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신호를 찾아내는 연구를 했다. 세계적 저널인 ‘과학, 기술, 사회(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에 실었다. 이를 활용하면 국가 및 기업들은 대규모 예산을 들이거나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도 오픈 이노베이션 정책 영역이나 기업의 전략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다.”
― KISTI와 공동 연구를 많이 해왔다.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와 데이터 마이닝(발굴)에 유리하다. 논문 데이터도 가장 잘 구비하고 있다. 양질의 신속한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있다. 협업할 우수한 전문가들이 많다는 점은 더욱 큰 장점이다. 정의섭 박사는 국내 특허 데이터 및 오픈 이노베이션 데이터 마이닝의 1인자다. 박진서, 원동규, 김상우 박사 등과 오래 같이 일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KISTI는 개방적 연구 마인드와 시스템을 갖춰 협력 연구에 유리하다.”
―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해나갈 생각인가.
“연구 이야기를 하니 고 이민화 교수님이 생각이 난다. 같이 논문을 많이 썼는데 2018년에 엘스비어 저널에 공동으로 낸 ‘4차 사업혁명 또는 2차 정보기술 혁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How to Respon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r the Second Information Technology Revolution?)’ 논문이 28일 기준으로 701회나 인용됐다. 앞으로 인용이 1000회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이 교수님은 오픈 이노베이션이야 말로 한국의 미래라고 얘기했다. 나는 자본주의의 미래라고 본다. 오픈 이노베이션 경영학 이론을 경제학 이론과 결합시키는 것이 평생의 숙원이다.”
윤 책임연구원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석사, 고려대과학기술학 프로그램에서 기술경영경제학(이학박사)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KISTEP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했고 국내외 여러 대학에서 기술경제론, 기술정책론, 클러스터이론, 기술경영론, 정책평가론 등을 강의했다. 현재 엘스비어 오픈 이노베이션 저널의 ‘발행인 겸 창간 편집국장(Founding Editor-in-Chief)’을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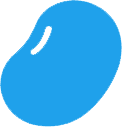
댓글 정렬